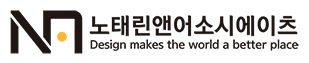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시론] 우리는 어떤 공간에 살고 있을까?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를 저술한 지 어언 3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3년이라는 세월은 변화의 파고가 한바탕 휩쓸고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공간에 한정하여 이야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변화는 더디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나 <오즈의 마법사>에서 순식간에 공간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현상은 현실에서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공간디자이너는 요술봉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재능을 쥐어짜듯 쏟아내고 영감을 받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한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공사’보다 ‘공간’의 가치가 먼저 떠오르곤 했다.
이번 칼럼을 기고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늘 고민하고 업으로 삼는 대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공간이 가지는 아름다움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려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물음을 던져본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을까?”
공간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다시 말해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단지 배경이 아니라 살아 숨 쉬고 영향을 주고받는 입체적인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쉬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행복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또 죽기도 한다. 그래서 공간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는 곳인지, 누가 있는 곳인지, 편한지 등등 따지는 게 아닐까. 결국 사람이 머무는 곳인 공간의 의미는 단순할 수도 있다. ‘공간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거의 10년 전쯤 캐나다에서 토론토의 어느 병원에 들어갔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마치 울창하지만 정돈된 고요한 숲속을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이런 분위기의 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떠올리며 조용한 병원 곳곳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다.
아름다운 병원 모습에 너무나 정신이 팔렸나 보다. 정작 이 병원은 어떤 곳인지 아무런 정보도 모른 채 사진만 찍었다. 나중에 떠올려보면 그저 숲속 같은 아름다운 병원이라는 기억만 떠올랐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작년에 다시 그 병원과의 인연을 우연히 이어가게 됐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Design health 2017’이라는 행사에서 그 병원을 디자인한 팀을 만났다. 그 팀이 병원의 숲속 같은 로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나는 감탄을 하고 말았다. 암 환자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이다. 1분1초가 아까운 환자들이 일부러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이 없이 바로 진찰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디자인 콘셉트였다. 로비에 스테이션과 같은 기능을 아예 없앤 공간 설계를 한 이유이다. 내 눈에는 아름다운 숲속처럼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환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공간은 사람이 그곳에서 경험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고 기능에 따라 구획한다고 해서 공간을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공간의 분할은 도면을 펼쳐놓고 자로 재고 연필로 선을 긋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저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겉멋이 잔뜩 깃든 공간도 삶을 배려하지 못하면 흉물이 되고 만다. 공간이 가지는 가치의 깊이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인간을 이해해야 찾을 수 있다. 공간디자이너는 인문학자이자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까지 살펴보는 문화인류학자의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공간은 ‘공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된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은 과연 어떤 곳일까?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하나마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은 훌륭한 공간의 가치를 갖춘 셈이다.
노태린 노태린 앤 어소시에이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