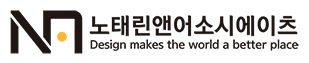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데코저널 칼럼 - 노태린]
병원 디자인은 왜 다른 공간 디자인과 차별화되어야 하는가?
병원은 병원 그 이상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병원을 여느 상업 공간 못지않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성형외과나 치과는 세련미의 극치를 내세우는 게 중요했다. 클라이언트와 논의할 때도 화려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서 평당 단가를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다. 보기 좋은 감이 맛도 좋다는 소리만 할 뿐이었다. 인테리어 회사들은 병원 인테리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여전히 상업 공간의 일부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 세련된 숍의 디자인으로 외형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말이다. 요즘 들어 나를 두고 부르는 호칭이 있다. 그동안 작업의 90% 가까이를 병원디자인에 몰두하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느덧 ‘병원 전문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이런 특별한 이력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지금 보면 제목부터 부담스러운 “종합병원 리모델링”이라는 책을 출간한 뒤부터였다. 이 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했다. 병원 리모델링이나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단지 외형적인 스타일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공간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들이 바라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공간을 변화시키며 일상과 삶도 바뀌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 대형 종합병원과 고작 의사 한 명이 환자를 돌보는 의원급의 병원은 많은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부터 눈에 띈다. 어떤 병원이든 아픈 환자와 의료진이 디자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아픈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병원 디자인은 겉으로 보이는 마감재의 비싼 향연이 아니다. ‘내 집 같은 병원’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온종일 지하 공간에 있어야 하는 근무자들이 햇빛 한번 비추지 못하는 곳에서 환자를 웃으며 대할 수 있을까? 아파서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휘황찬란하고 값비싼 대리석으로 감싼 벽면에 눈에 들어올까? 공간 디자인은 실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지내야 하는 공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매번 환자와 의료진의 귀와 눈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최근 어느 병원의 오픈 행사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당시 행사는 단순한 의전행사가 아니었다. 병원장이 스트레쳐 카(stretcher car, 환자이동용 침대) 위에 누워 병원 입구부터 둘러봤다. 환자의 입장에서 공간의 동선과 구조를 바라본 것이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병원을 고치면서 일부러 휠체어에 타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인 디자인sign design을 하곤 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예컨대, 지하 검사실에 늘 근무하는 스텝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도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들은 일과의 대부분을 지하에서 머문다.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있는 심정은 어떨까. 환자를 맞이할 때 과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떠올리고 답을 구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이다.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경건축학의 접근과도 일맥상통한다. 공간 디자인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모두가 위로받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디자인. 공간 디자인의 다름은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