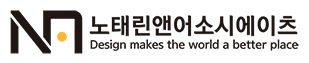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 이 글은 중앙일보에 기재된 글입니다 (2015.06.08 15:16)
메르스 감염실태, 응급실부터 확 뜯어 고치자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의 공포로 떨고 있다. 병원을 그 누구보다 오가는 나도 이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스멀스멀 공포감이 내 일상을 뒤덮는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병원 중에 한 곳인 D병원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D병원의 응급실이 리뉴얼로 새단장을 했다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다. 그때 본 응급실의 공간을 떠올려보니, 지금의 메르스 감염 사태가 환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급실의 구조와 운영이 이번 사태를 키우는 데 한몫을 한 셈이다.
당시 D병원의 응급실은 입구에 예진실이 있다. 환자 분류를 위한 장소인데, 단지 외상만으로 경증과 중증을 구분할 뿐이었다. 응급실 내부로 들어가면, 기존의 응급실 구조와는 다른 디자인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의료진이 환자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반면에, 이곳은 환자 분류를 통한 공간 분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칸막이 벽을 설치한 D병원의 응급실은 환자를 빠르게 분류하여 각각의 방에 데려다 놓는 것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대지 않게 하려는 목적만이 엿보이는 공간이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초기에 특별한 처치가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배려만 생각해서 경증 환자라도 빨리 자리를 내어준다는 취지였으리라. 하지만 평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밀폐된 크고 작은 공간으로 쪼개진 응급실은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개의 공간으로 분할되고 말았다. 또한 일차로 경증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베드가 아니라 베드의 역할을 대신하는 암체어를 놓았다. 즉 환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베드와 베드 사이의 간격을 무시하고 일반 대기 공간처럼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하니 마치 난민수용소를 연상케한다.
독립된 공간의 분류는 외상과 감염 등 각 처치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배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응급실을 잘게 쪼개 놓는 바람에 공기의 흐름 시설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올랐을 테다. 공간이 좁아지면서 밀폐공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병원의 응급실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설비를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 만든 도면도 볼 수 없었으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몰리는 모습만 봐도 감염의 우려는 지울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병원 내 감염이 유독 응급실 공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응급실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D병원의 응급실 리뉴얼 콘셉트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감염 사태를 겪지 않고 있던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일차 환자들의 분류에서 외상이 없는 경증 환자들에게도 암체와 같은 의자를 내줘 편하게 대기하도록 한 배려가 돋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문제와 실질적인 배려는 배제된 셈이다. 응급실의 베드 간격이 무시된 것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환자들이 감염에 대한 처치에 대해 서로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면, 중환자실의 환자 베드 사이는 적어도 1.5m의 간격을 보장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D병원의 응급실 리뉴얼은 비단 그 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영향력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니만큼 이미 선례가 되어 이러한 추세로 응급실 디자인을 한 병원이 많아져 가고 있을 텐데. 왜 이런 공간 디자인을 했을까? 아마도 공간 이해력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팀에게 디자인을 맡긴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을 테다. 실제로 리서치가 강점인 서비스디자인 회사가 총책임을 담당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환자 막을 수 없다”는 기본 전제하에 환자를 빨리 수용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염두를 두고 기본 의료시설 개념과 공간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이 병원이 앞 서 말했듯 병원의 건축과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회사가 아닌 거액의 디자인 비용을 받고 응급실 상황과 환자 리서치뿐만 아니라 전체의 디자인을 총괄했다고 한다. 이 팀은 IT와 병원 공간을 접목시킨 사례로 주목받았다. 신속한 환자 수용 체계와 최첨단 응급실 공간을 표방하고, 또 ‘분노가 사라진 응급실’이라는 표현까지 자랑스레 내세웠다. 주위에서도 이 병원의 사례를 성공사례로 받아들였고, 다방면에서 발표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응급실을 둘러본 나로서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뭐가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이고, 응급실의 기능인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 지금은 분노가 사라지기는커녕 분노을 마구 일깨우는 응급실이 되고 말았다.
메르스 사태를 보고 있으면, 당시 D병원의 응급실 디자인은 쇼룸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응급환자를 많이 받기 위한 눈가림, 혹은 과시가 오만하게 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첫발을 들여놓는 응급실 디자인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재난이나 응급상황이 벌어져 응급실을 다급하게 사용할 때를 대비한 공간 배치를 하고 있다. 우리도 환자의 유입이 많은 외래 공간과는 멀리 떨어지거나, 혹은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D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병원이 아직도 외래와 문 하나로 통하는 응급실을 두고 있다.
메르스의 광풍과 D병원의 응급실이 오버랩되면서 또 한 번 공간 디자인의 가치를 떠올린다.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에 현혹되거나, 또는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편의적인 발상에 그치는 디자인 등이 우리 일상에 이처럼 크나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D병원의 응급실은 여전히 최첨단 응급실이라는 이유로 모범적인 병원 디자인으로 알려지고 있을 텐데, 공간의 본질을 망각한 디자인이라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 병원부터 감염과 환자의 고통을 배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메르스 관련 속보가 계속 뜬다.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의 감염 소식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가 문자로, 뉴스로, 수군거림으로 떠돌아다닌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패닉에 빠졌고, 정부의 발표나 대처방안에도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에 나선 꼴이 돼 버렸다. 그런데 병원과 응급실 공간이 감염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 다른 말이 없다. 특유의 간병 문화와 위생, 에어컨을 통한 확산 등의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디자인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디자이너 개인과 병원의 개별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눈으로 응급실과 병원 공간을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미 곳곳에서 정부와 병원의 뒤늦은 대응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한다. 나도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정부와 병원의 당황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과거 사스에 대한 대처를 그토록 훌륭히 했으면서 왜 지금은 이리도 지리멸렬한지 불만이다. 하지만 잃은 소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을 분명히 묻되,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쳤으면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외양간이 아니라 치유와 안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외양간, 즉 생명을 위한 응급실 디자인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공간 디자이너 노태린 (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저자 / 노태린 앤 어소시에이츠 대표)
기사 원문: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1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