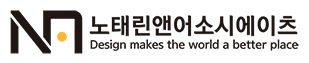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 이 글은 중앙일보에 기재된 글입니다 (2015.07.21 17:59)
신입 디자이너에게 현장 실무는 비상의 기회이다
장맛비를 잠시나마 피하려면 처마 밑도 훌륭한 공간이 된다. 늘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알 수 없는 길거리의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옆 오솔길이 피톤치드 향 가득한 북유럽의 숲만큼은 아니라도 일상에 찌든 피로를 다소나마 덜어주는 데 손색이 없다. 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소소한 곳의 비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게 어쩌면 인생의 여정일 수 있다. 공간을 작업할 때도 무수한 비밀과 성공의 비법은 도면이 아니라 직접 가야 볼 수 있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매년 실습생과 함께 지내고 있다. 2달 남짓한 실습기간 동안 실무를 익히려고 찾아온 학생들이다. 실습기간 동안의 활동이 대학 졸업 성적에 반영되니 눈빛은 반짝거리고 행동은 민첩하다. 이 학생들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설계사무소나 디자인 기획만 하는 사무소에서 무엇을 배울까? 두어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껏해야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도면 설계나 자료 찾기와 조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큰 회사는 각자의 업무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우리 사무소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딱히 본연의 업무라 할 게 없다.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직원들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개개인 역량은 말 그대로 만능!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고서는 버티기 어렵다.
실내건축 전공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볼 때가 많을텐데. 아마도 사무실에 오기 전까진 연필을 귀에 꽂고 도면을 이리저리 바라보거나, 적어도 건축학 개론에서 나오는 건축가 모습의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 닥쳐보면 완전 딴판. 세상은 녹록지 않고 더구나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사무소에 인턴으로 발을 담는 그 순간 꿈은 현실의 배반과 함께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스펙을 쌓아도 실제 현장에 서면 어리바리한 사회 초년생이란 이름으로 서 있을 뿐이다.

일머리가 모자란 학생들은 현장에서 상상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며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도면으로 시작해서 실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울상을 짓는다. 때로는 일에 치여 삭막한 사무실 분위기를 한순간에 웃음바다로 바꿔 놓는 실수도 종종 일어난다.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이 알아서 따라주지 않는 게 이 일이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도 현장관리 업무는 어렵고 돌발 상황이 많아 즉흥적인 대응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부딪쳐보지 않고서는 단단해질 수 없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계산되던 이론들이 실제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난항을 겪기 마련이다.
그 누구도 신입이 아닌 적은 없다. 그래서 풋내기의 티를 팍팍 내던 추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이라 해도 누군가는 두각을 나타낸다. 실수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과감하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이런 신입사원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신입사원이나 실습생이 들어오면 꼭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
20여 년 전, 처음 사무소를 작게 꾸릴 때였다. 별 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뛰어든 일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았다. 하지만 오너라는 이유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때였다. 마침 큰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이었던 탓에 이래저래 몸과 마음고생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힘들게 일을 하던 중에 대학을 갓 졸업한 내 또래의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어느 날, 내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사무실이 확 바뀌어 있었다. 그 사원이 열 평 남짓한 작은 사무소의 가구들을 새로이 배치하고, 사무실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바꿔 놓았던 것이다. 내가 좀 전까지 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분위기였다. 작은 구멍가게나 같은 사무소였지만 주변이 달라 보일 정도로 깔끔해지고 말았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풋내기라 해도 그 직원은 확실히 달랐다. 다른 선배 직원들보다 자신감이 넘쳤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도 탁월했다. 입사 때부터 두드러지게 자신감이 넘치고 과감하게 일을 하였기에 직책도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클라이언트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자연스레 그와 함께 하는 동안에는 사무소의 일도 부쩍 바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직원은 이후 독립을 하여 자신의 사업체를 꾸렸다. 누가 봐도 언젠가 독립할 만큼의 능력을 갖췄고, 또 자신감이 넘쳐 흘렀으니 나 역시 박수를 쳐줬다. 이처럼 직종이나 직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빛을 보기 마련이다. 어느 분야라도 신입의 자리는 힘겹고 서러운 딱지를 붙이고 지내기 일쑤다. 그런데 디자인 사무소에서 는 이 딱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떼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시공 현장에 나가 일을 직접 해보는 것이다.
신입사원이 현장에 처음 나가면, 말도 쉽게 건네지 못하고 우물쭈물 눈치 보기에 바쁘다. 학교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따위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 현장 사람들만의 무뚝뚝한 인상과 다소 거친 분위기에 겁을 먹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수가 회사에 누라도 끼칠까 봐 더욱 소심해진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일의 공정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각각의 일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몰라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바쁜 현장에서는 그 누구도 살뜰하게 신입을 챙겨줄 여유가 없다. 이럴 때에는 머쓱할지언정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게 어떨까? 눈치 없다고 핀잔을 듣더라도 먼저 다가서는 신입은 현장 직원들에게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신입이라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모르는 것을 배운다면서 다가서는 것이다. 목공반장님, 페인트 아저씨, 도배하는 이모와 삼촌들까지 모두가 나의 스승일 테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갯벌에 모래 속에 숨은 진주일 뿐이다. 진주가 세상의 빛을 보려면 흙더미 현장에서 꺼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빛이 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그려왔던 도면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일이 보일 것이다. 그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주가 찬란한 세상의 빛을 머금고 자신의 영롱한 빛을 선 보일 때다.
곱게 자란 요즘 세대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을 받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반드시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부모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줄 사람은 없다. 공사 현장에서 목수반장님께 물을 사다 드리고, 쓰레기로 가득 찬 공사현장을 알아서 미리 치울 줄 알고, 자신이 담배를 피지 않아도 인부들을 위해 담배를 사다 주는 마음 씀씀이는 내가 현장에서의 관계를 맺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셈이다. 이런 마음 씀씀이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다. 그리고 주위에서 “젊은이가 사람 됐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동료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장의 노하우가 하나씩 무용담으로 전수된다. 그때가 바로 진짜 이 세계에 입문하는 순간이다.
글 : 노태린 / 노태린 앤 어소시에이츠 대표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홍보이사 /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