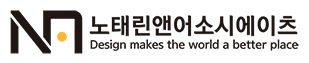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 이 글은 중앙일보에 기재된 글입니다 (2015.10.14 14:03)
병원에서 더 절실한 공감의 디자인
어느덧 시원하다 못해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초가을이다. 집이나 사무실, 혹은 병원 안에서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모여 있는 곳을 찾는다. 공간이 화려하거나 혹은 초라해도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햇살 한 줌의 행복을 만끽하는 사이에 온갖 요구 사항이 담긴 공간디자인 의뢰 서류를 보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나의 클라이언트는 거의 모두 병원이다. 의료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채워줘야 하는 과제는 늘 어수선한 과정들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다른 공간 디자인의 과정과 다른 게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을 글을 쓰며 책까지 내게 됐다. 병원이 아닌 다른 분야의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책까지 쓰기보단 전후 달라지는 포트폴리오로 나의 디자인 의도를 전해보려고 했을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어야 할까?
병원 디자인에 대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누구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가’라는 물음 때문이다. 병원 디자인의 초창기 시절 때, 클라이언트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디자인의 만족 기준은 돈을 지불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가 장시간 머무르는 특수한 곳이다. 디자인의 만족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 동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병원은 장날 시장터만큼이나 복잡하고 어수선하다. 이런 곳에서 머무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스텝들도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일쑤다. 처음에는 이런 시장 바닥 같은 곳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병원이니 만큼 청결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클라이언트, 의료진, 시설 관리자, 환자 등 곳곳에서 이런저런 요구 사항이 쏟아졌다. 도대체 누구의 기준에 맞춰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느라 몸과 마음은 곤죽이 되어 퍼져버렸다.
디자이너의 위신을 세우며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일찌감치 버렸다. 병원에 머무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디자이너가 아니라 소통의 메신저가 된 것인 양 듣고 또 들으며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지난하게 거쳐야만 했다. 그러자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도 모르고, 때로 내가 디자인을 한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내 생각을 반영하기보다 서로의 조율과 협의로 너덜너덜해진 도면들, 간혹 아무런 콘셉트가 없이 진행되는 일들 때문에 서서히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디자이너라는 자각보다 ‘여긴 어디이고, 나는 누구냐’며 중얼거리는 공사 실무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병원 디자인의 본질이었다.

공감으로 디자인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쏟아지니 가끔 서로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디자이너인 나와의 충돌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의 충돌이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귀를 열어놓더라도 필터링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서는 이것저것 맛있는 재료를 다 넣는 바람에 오히려 먹지 못할 기괴한 음식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율을 하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혜안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사함이 필요하다. 그 혜안을 갖춘 이가 바로 디자이너이어야 한다.
건축에 관한 지식과 공간을 보는 미적 안목까지 갖춘 디자이너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처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만족 기준을 조율하며 소통해야 하는 공감 능력은 교육 과정에서 미처 배우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와서야 공감 능력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감 능력은 병원 디자인의 초창기 때부터 좌충우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다. 현장에서의 공감 능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런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 공감 능력이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될 테고, 또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자질일 것이라는 예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어느덧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병원에 대해 먼저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과 그 공간의 쓰임새에 대해 공부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나의 회사는 점점 이런 마음에 공감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헬스케어의 컨설팅에 대해서 적잖은 고민을 나누는 중이다. 병원에서 공간을 통한 가치 창출이 과연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헬스케어 컨설팅을 한다면서 별다른 대안이 없이 말로만 그럴듯한 의견을 제시하고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컨설팅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끔 한다. 클라이언트도, 환자도, 의료진도 아닌 컨설턴트를 위한 디자인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업에서 사람들과 부딪치며 조율했던 결과로 공간의 실체를 만들고 사례로 보여준 경험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그 덕분에 갈수록 공감 능력을 강조하는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며 찾아오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이제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문의가 늘어나는 만큼이나 미팅 일정이 빽빽하게 들어찬 스케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온몸이 피곤하고 입술이 부르터도 기지개를 펴고 또다시 공감을 나누려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토록 기대하던 병원 디자인의 새로운 변화를 담은 바람은 쌀쌀한 기운을 감싸주는 훈풍이지 않는가.
글/ 사진 : 노태린 노태린 앤 어소시에이츠 대표 /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 저자
출처 :
- http://jhealthmedia.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