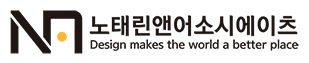무서운 병원은 싫다 1 - 웨이파인딩 (표지판)
'빨강이 무섭다라는 말에'
병원 리모델링을 일삼아서 하는 나는 하루에 몇 군데의 병원도 들락거리는 게 일쑤다. 물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일상까지야 아니지만 어느날은 2끼 이상을 병원에서 먹는 경우도 생긴다. 어느덧 병원 환경에 젖어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며 변화를 주도하는 리모델링마저 새로움조차 어느 형식을 갖춰 틀안에서 고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 요즘이다.

최근 페북으로 소통하는 건축과 교수님 한 분이 병원에 종일 환자의 보호자로 지내면서 순간의 단상을 써서 올린 사진들과 글을 삽시간 보게 되었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의례적인 빨간색이 식별력은 있을 지라도 환자들에겐 무서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동의하지만 의례히 응급의료센터의 사인들을 붉게 디자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급의료센터 사인에 레드를 넣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레드가 사람의 감정을 순간 응집하게 하여 빠르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웨이파인딩에 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빨강으로 크게 써놓더라도 접근성이 곤란한 어느 구석에 응급센터를 배치해 놓는다면 환자의 위급한 생명을 앞에두고 찾아가기 어려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사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 갈 수 있기 가장 편리한 곳에 응급실이 배치 되어야 하는게 관건일 것이다.


위의 사례는 레드를 주종색으로 쓴 어느 병원의 환자보호자 대기실과 접수공간인데 병원이란 특수성으로 레드가 사인에 쓰여지는 긴장감과는 달리 공간에 접목되어 환기를 시켜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물론 색상의 일반적인 감정코드로 인해 병원에서만큼은 붉은 색을 공간에 선호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조금 다른 외국 사례이긴 하다.

응급의료센터의 붉은 색의 위화감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 중의 일부를 보면서 글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인이 있어서 소개해 본다. 스페인의 그래픽 디자인의 거장 하비에르 마리스칼은 어린이 병원의 사인들을 위의 그림처럼 나타냈다. 이 중 두번째 그림(왼편 가운데) 이 응급실이고 피범벅인 아기새를 구하기 위해 힘껏 달리는 고양이의 모습이다.



일본의 우메다 병원에서는 빨강 하나로 모든 사인을 통일시겼고 디자인을 가미하여 바닥에 사인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환자에게 빨강의 감정적인 흥분감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단순화된 기호의 디자인으로 병원과 매치되고 웨이파인딩의 역할을 톡톡히 돕는 멋진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위급함을 표현하는 사인들이 많이 있다. 어떤 것이 맘에 드는가? 또 어떤 것이 환자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눈에 가장 빨리 들어오고 갈 길을 찾아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이라면 고양이 위에 피흘리는 새를 보고 응급실로 식별하기까지 환자들은 얼마나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든다. 디자인엔 디자이너 자신의 감성이 녹아나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곳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히 병원을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작년 캐나다에서 뜻하지 않게 방문했던 암센터 병원에 걸린 표지판이다. 병동마다 걸려있던 이 표지판들은 TREE/ MAPLE/DEER 등 캐나다만이 자랑하는 수려한 목재와 그들만의 감성이 담긴 특유의 단어들로 병동을 표시하고 있었다. 참 인상적이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병원이란 삭막한 곳에 따뜻한 감성이 있어 아름답고 통일감 있는 사인으로 병원나름대로의 분위기를 살려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 줄 수 있는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 그 병원은 마음 깊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다 . 늘 병원을 고치면서 환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통일감 없는 사인으로 중구난방 우왕좌왕 하며 헤매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누구나 그럴것이라는 감성으로 접근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표식보다는 감성과 마음이 담긴 사인이 무척 중요하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