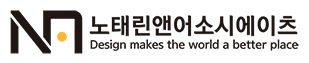아름다운 공간이라는 평가는 철저한 세심함이다
“여러 병원을 작업했으니 안 봐도 견적이 딱 나오지 않아요?”
디자인 작업을 하러 병원에 들를 때 종종 듣는 말이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늘 한결같다.
“병원을 둘러보러 갈까요?”
그동안 숱하게 병원 공간을 둘러보고 작업을 했어도 꼭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병원 입구부터 곳곳의 다양한 공간 풍경이 떠오른다. 한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름만 다를 뿐, 병원 안의 모습은 거기서 거기였다. 둘러보나 안 보나 뻔한 공간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둘러보지 않아도 알지 않느냐며 차 한 잔 하러 가자고 한다. 그러나 내 대답은 둘러보자는 것이다.
차 한 잔의 여유를 마다하고 다시 병원 안에 들어서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공간이 어떤지 직접 보고 들으려고 병원 곳곳을 둘러본다. 머나 먼 울진까지 가게 된 것도 이런 나의 디자인 가치 때문이다.
3주 전에 억센 경상도 사투리의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울진의 한 병원이었는데, 병원 리모델링을 꼭 우리 사무소와 하고 싶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울진까지 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나 연락이 왔는데 가보지 않을 수는 없는 터라 먼 길을 나섰다.
처음 가 본 울진은 멀긴 멀었다. 그곳까지 가는 게 다소 힘에 부쳤지만, 왜 그 병원에서 나를 찾았는지를 듣고 나니 헛걸음이 아니라는 생각에 금세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이 병원의 담당자는 사전에 나와 우리 사무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 특히 우리 회사가 치유적 관점에서 병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곳 병원도 따뜻한 병원을 추구하고 있었다.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과 걷고자 하는 길이 같으니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나로서는 또 한 번 실속이나 이익을 챙기기보다 마음을 빼앗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셈이었다.
내가 찾아가게 된 울진의 한 병원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울진으로 들어서는 곳에 있는 이 병원은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센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게 좋을 듯했다. 또한 넓은 부지와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갖춘 것을 보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런데 이 병원도 다른 병원들과 비슷비슷한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조금은 씁쓸했다. 마치 신혼부부가 살든, 노부부가 살든 간에 택지 지구의 천편일률적인 2층 주택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말이다.
몰개성의 병원이 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수첩과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제부터 병원을 둘러보는 디자인투어의 시작이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정보가 없이 보고 듣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와 눈을 활짝 열었다. 1층을 둘러보니,나름대로 깨끗한 마감재로 병원 구석구석을 단장하였고, 환자들에게 쾌적함과 편리함을 주기 위해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여느 병원과 다를 게 없는 깔끔한 풍경이었다.
2층은 정원도 만들어놓고, 산책로처럼 보이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보였다. 그런데 출입구의 문은 다른 문들과 똑같이 위아래를 녹색의 필름이 띠지처럼 입혀져 있었다.


풍경이 좋은 바깥 전원으로 나가는 문마저 왜 다른 문처럼 저렇게 일부를 녹색으로 가렸을까?’
모든 출입문을 굳이 똑 같은 디자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각각의 공간 기능을 생각한 디자인을 하는 게 보기 좋을 뿐 아니라 공간의 구분이나 기능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녹색의 바깥 풍경이 바로 보이는 문에 녹색의 필름으로띠지처럼 붙여놓은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 때문이었을까?
병원 곳곳에 있는 게시판의 게시물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고령의 환자들이 많은 이 병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게시판은 휠체어에 앉은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가 아니라 일반 성인들이 서 있을 때 편히 볼 수 있는 눈높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고개를 잔뜩 젖힌 채로 불편하게 바라보는 환자들의 표정은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게시판들은 사용자보다 만든 사람의 시선만 고려했을 뿐이다.
울진의 병원을 둘러보며 또 한 번 공간 안의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렸다. 환자의 입장에서 산책을 즐기려다 만나게 되는 출입문, 휠체어에 앉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시판 등 대부분의 디자인이 사용자가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사소하지만 사용자의 시선을 감안한 디자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평가는 사실 머무는 사람의 몫이다. 사소한 불편함이 곳곳에 널려 있는 공간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그래서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귀담아 듣고 곱씹어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심한 배려와 디테일의 기본이다.

사소한 것은 가까이 살펴봐야 놓치지 않는다. 겉으로 봤을 때의 멋스럽고 아름답게 지은 병원이 훌륭한 공간의 동의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공간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목소리를 내는 공간 사용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의견을 담아내며 절충과 배려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 디자인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살이의 지혜를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모든 사용자가 서로 절충하고 배려하는 디자인 과정은 더불어 사는 세상살이의 지혜와도 같다.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서로 물고 뜯거나 아예 무관심한 세상을 조금씩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