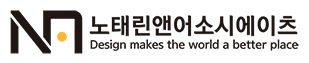※ 이 글은 디지틀조선일보에 기재된 글입니다 (2014.09.01 19:36)
치료의 최종목표는 치유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당연히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간다. 너무 쉬운 질문인가? 그럼 질문을 바꾸어 보자. 병원은 왜 병을 치료하러만 갈까?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꼭 쇼핑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듯 병원 역시 치료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걸까?
최근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에도 식당이나 커피숍,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 병문안객, 의료진과 직원 등이 전부인 듯하다. 그 말은 곧 병원에 특별한 업무가 있지 않으면 혹은 아프지 않으면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제 병원도 동네 시장 들르듯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원 문턱이 높으면,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물론이고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보통 나쁜 일은 자신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잊지 말아야할 것은 우리도 잠재적인 환자라는 것이다. 나와는 거리가 먼 것만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굳이 암 발병률과 같은 통계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실제로도 주위에서 쉽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환자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특별대우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환자들을 환자가 아닌 사람들과 구분지어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과연 그들을 위하는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미국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찾기 힘든 이유’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한국에서 20여 년간 개발자로 일하다가 최근에 미국유학을 결심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신데, 이 글에 의하면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없단다. 그냥 일반 화장실 크기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히고 벽에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바를 설치해 놓은 게 전부란다. 이 간단한 시설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건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먹고 싸고 자고 이동하는 등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란다.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를 가정해보아도, 나 역시 같은 마음일 것 같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치료라는 명목하에 병원에 갇히거나 격리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너무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내 몸을 병이 생기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몸이 나았어도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았다면 그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돌봐주는 것까지 병원에서의 치료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환자들의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치유라고 한다면, 치료의 최종 단계는 치유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병원이 알게 모르게 환자들을 ‘특별대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앞으로의 병원은 환자들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내가 앞서 병원의 문턱이 낮아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병원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격리시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기능한다면, 환자들은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대신 나 역시 이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 중의 하나라는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병을 치료하러만 병원에 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친구를 만나러 병원에 간다, 식사를 하러 병원에 간다, 차를 마시러 병원에 간다, 음악을 들으러 병원에 간다, 책을 읽으러 병원에 간다, 산책하러 병원에 간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은 더 이상 단절과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편하게 병원을 드나들며 검진 받고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환자와 잠재적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병원’이 아닐까.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 요양병원보다는 내 일상과 가깝거나 비슷한 환경이 펼쳐진 곳에 들어섰을 때의 안온함으로 자연스레 치유가 시작된다. 시골에서 마주치는 흔한 풍경인 논두렁 원두막을 세워 전원 그대로의 모습인 이 곳은 올 봄에 증축시공한 제천에 위치한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어진 치매 노인 요양 병원이다.